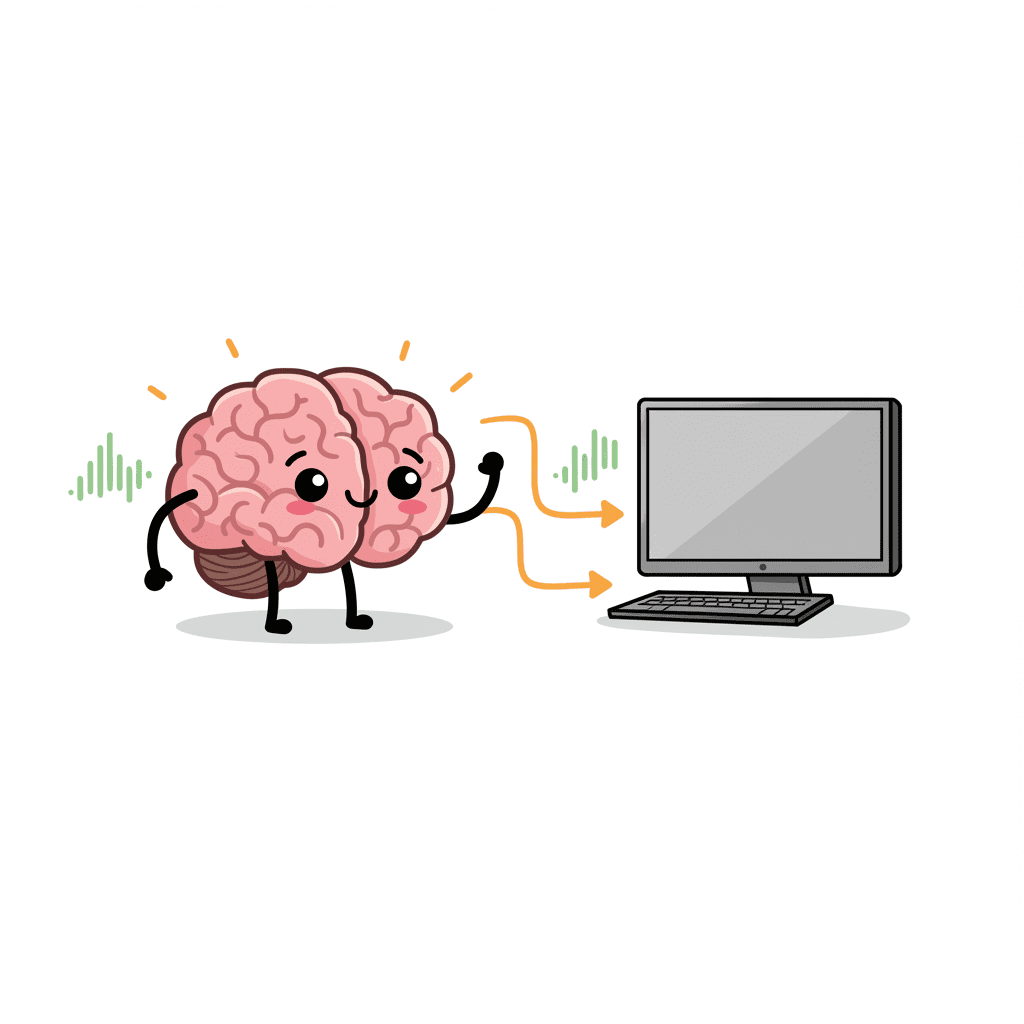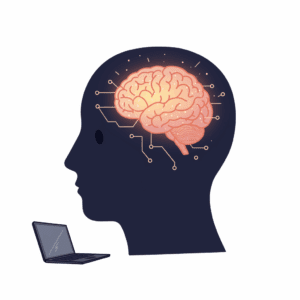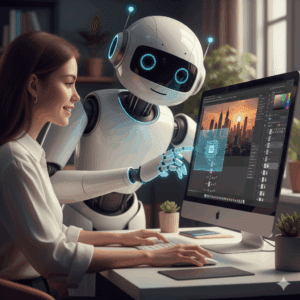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허기를 달래줄 지식 맛집, TMI 공장입니다. 🏭
요즘 어딜 가나 ‘AI’ 이야기뿐이죠?
질문만 하면 소설도 뚝딱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는 챗GPT나 미드저니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쟤들은 대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거지? 혹시 컴퓨터 안에 사람 들어있는 거 아냐?” 🤔
물론 사람은 안 들어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시급은 제대로 챙겨주고 있겠죠?)
이 똑똑한 친구들의 머릿속, 아니 CPU 속을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AI의 뇌라고 할 수 있죠. 🧠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녀석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렛츠고!
🧐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대체 뭔가요?
용어부터 뭔가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고요?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이름에 모든 힌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인공’으로 만든 ‘신경망’.
맞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뇌에 있는 신경망 구조를 그대로 본떠서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죠.
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물론 Ctrl+C, Ctrl+V처럼 간단하진 않아요!)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이란?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모방한 컴퓨팅 시스템입니다. 뇌의 기본 단위인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 신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인공신경망도 수많은 ‘노드(인공 뉴런)’들이 계층을 이루어 연결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결국 컴퓨터에게 ‘생각하는 법’ 대신 ‘학습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습 도구인 ‘인간의 뇌’를 커닝한 셈입니다. 📝
뇌 구조 커닝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뇌 작동 원리 엿보기!
우리 뇌에는 수천억 개의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뉴런들은 ‘시냅스’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서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하죠.
인공신경망도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 뉴런 ➡️ 노드(Node) 또는 퍼셉트론(Perceptron): 인공신경망의 기본 단위입니다. 데이터를 입력받는 계산 장치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 시냅스 ➡️ 가중치(Weight):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선입니다. 이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중요도’ 값, 즉 ‘가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냅스 연결이 강할수록 신호가 잘 전달되는 것처럼, 가중치가 높을수록 해당 입력값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신호 전달 ➡️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 뉴런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을 받아야만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노드도 입력받은 신호들의 합이 특정 기준(임계값)을 넘어야만 다음 노드로 값을 전달합니다. 이때 ‘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활성화 함수’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용어만 기억하면 여러분은 이미 인공신경망의 절반을 이해한 겁니다! 폼 미쳤다! 👍

예를 들어 인공신경망에게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고양이니?’라고 물어보는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인공신경망은 사진을 받아서 여러 계층의 노드들로 보냅니다.
- 입력층: 사진의 픽셀 하나하나를 데이터로 받아들입니다. (예: 뾰족한 귀, 동그란 눈, 수염 등)
- 은닉층: 입력층에서 받은 데이터들을 조합하며 특징을 분석합니다. 이때 수많은 노드들이 ‘가중치’를 바탕으로 “음, 뾰족한 귀는 고양이일 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특징이군!” 혹은 “털 색깔은 별로 안 중요해” 와 같이 스스로 판단하며 정보를 다음 단계로 넘깁니다. 이 은닉층이 많을수록 더 복잡하고 깊은 학습이 가능한데, 그래서 ‘깊은(Deep)’ 학습, 즉 ‘딥러닝’이라는 말이 나온 거랍니다! ✨
- 출력층: 은닉층에서 처리된 최종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 결과, 85% 확률로 고양이입니다!” 와 같은 결론을 내놓습니다.
만약 인공신경망이 틀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땡! 그건 강아지야!”라고 정답을 알려주면, 인공신경망은 ‘역전파(Backpropagation)’라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오류를 수정합니다.
출력층에서부터 거꾸로 되짚어가며 어떤 ‘가중치’ 때문에 틀렸는지 계산하고, 다음에는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가중치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죠.
수백만 번의 오답노트를 쓰는 성실한 모범생 같지 않나요? 🤖
우리 일상 속 스며든 인공신경망
“그래서 그 복잡한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공신경망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 유튜브, 넷플릭스 추천 알고리즘: 여러분의 시청 기록을 분석해 취향을 저격하는 다음 영상을 추천해 주죠.
- 스마트폰 사진첩 인물 분류: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을 인식해 자동으로 앨범을 만들어 줍니다.
- 파파고, 구글 번역기: 수많은 문장 데이터를 학습해 자연스러운 번역을 제공합니다.
- 알파고와 챗GPT: 말할 것도 없죠? 인공신경망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신경망은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기술이 되었습니다.
우리 뇌를 본떠 만든 기술이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 누군가 챗GPT의 원리를 물어보면 “음, 그건 말이지…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이라는 걸 쓰는데…”라며 멋지게 아는 척할 수 있겠죠?
뇌피셜이 아닌, 진짜 팩트로 말이에요! 😉
오늘의 지식 한 스푼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재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